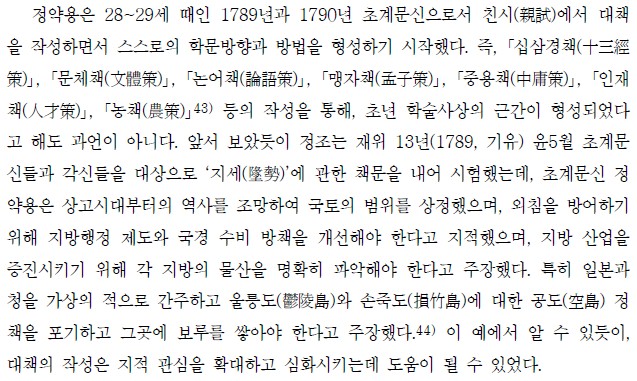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
다산 정약용 의 1790년 중용책(中庸策)의 출처에는 천주실의, 수신서학 등이 포함된다 1242_ |
|---|
|
2018-12-20 ㅣ No.1974 게시자 주: 본글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74.htm 에 접속하면, 본글 중에서 제시되고 있는 출처 문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q&a.htm 에 접속하면, 본글의 제목이 포함된, "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제공의 모든 게시글들의 제목들의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i) 2006년 12월 16일에 개시(開始)하여 제공 중인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날마다 영어 매일미사 중의 독서들 듣고 보기, 그리고 (ii) 신뢰할 수 있는 가톨릭 라틴어/프랑스어/영어 문서들 등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 (PC용, 날마다 자동으로 듣고 봄) [주: 즐겨찾기에 추가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m (스마트폰용) [주: 네이버 혹은 구글 검색창 위에 있는 인터넷 주소창에 이 주소 입력 후 꼭 북마크 하십시오]
1. 들어가면서
1-1.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인 "수신서학"이 다산의 성기호설의 출처 문헌들에 포함됨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졸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2.htm <----- 필독 권고
이번 글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수신서학"을 입수하여 학습한 시점이, 아무리 늦더라도, 1790년 12월임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789년 봄에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초계문신의 특전을 가졌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임금 정조의 중용 등의 본문 중의 특정 단락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작성하여 임금 정조에게 바쳤는데,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이들이 수록된 문집인 "여유당전서", 제1집 시문집, 제8권, 문집, 대책 중의 중용책 전문을 읽을 수 있으며,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유관 부분을 아래에 발췌하고 또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졸번역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출처: http://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597A_0080_010_0070&viewSync2=TR (발췌 시작) 주: 다음은 임금 정조의 질문 중에서 유관 부분임:
天命之性。開卷第一義。而人物之五常同異。爲大疑案。戒愼恐懼。爲學大頭腦。而動靜之通貫與否。作一爭端何歟。性也道也敎也卽三綱。而第二節獨言道字。喜怒哀樂愛惡 卽七情。而第四節只擧四者何歟。未發則性。已發則情。統之者心。中者大本。和者達道。發之者氣。而經文不言心不論氣何歟。
[...]
주: 다음은 바로 위에 발췌된 질문에 대한 다산의 답변 중의 유관 부분임:
臣以爲七情之說。昉於禮運。而情之可擧者。不止於七。如愧悔忮恨。明有異發。而無所歸屬。則七情未必統括人情。而此之四情。不必疑也。
신(臣)이 생각할 때에(以爲, 以為, think), 칠정(七情, seven passions)들에 대한 서술(說)은 예운(禮運, 주: 예기의 편명)에서 비롯하나(*1), 그러나 정(情)들에 있어서의 가히 열거(擧)할 수 있는 것들은 [예운(禮運)에서처럼] 일곱 개에서 그치지(止)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끄러워함(愧, ashamed), 후회함(悔, repent), 강하게 사나워짐/사납고 독살스러워짐(忮), 원한/원수로 간주함(恨) 같은 것(如, such as)들(*2)은 분명히 다르게(異) 발(發)하며, 그러나 [소위 말하는 일곱 개의 정들에] 귀속(歸屬)되는 바가 없는 즉, 칠정(七情, seven passions)들이 반드시 사람의 정(情)들을 통괄(統括)하지 않는다(*3)는 생각이며, 이에 따라서(而, and then) 이들 네 개의 정(情)들[만이 거기에서 언급됨]에 대하여 반드시 의문을 가질(疑)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 (*1) 번역자 주: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예기", 예운 중의 내용 출처 및 자구 출처인 단락을 읽을 수 있다: https://ctext.org/liji/li-yun?searchu=%E4%B8%83%E6%83%85&searchmode=showall#result
(*2) 번역자 주: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1603년에 공식적으로 출판되었고, "사고전서"에도 수록된, 마태오 리치 신부님의 저서인 "천주실의", 권하 중의 자구 출처들인 단락들을 읽을 수 있다: https://ctext.org/wiki.pl?if=en&chapter=938302
(*3) 번역자 주: 전후 문맥 안에서 바로 이러한 언급은,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저서로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신학 대전"(Summa Theologiae)의 가르침에 따라 정(passions)들에 총 11가지가 있음을, 유학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수신서학"을, 중용책을 작성하여 임금 정조에게 바치기 전부터 이미 초계문신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다산께서 문과에 급제한 1789년 봄 직후에 초계문신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소위 말하는 진산 사건의 결과로서, 대단히 애석하게도, 내각(즉, 규장각) 소장의 모든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의 소각령이 임금 정조에 의하여 내려진 1791년 11월 12일 사이에, 이미 입수하여 학습하셨음을 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입수하여 본문 사료 분석을 수행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 중에서, "수신서학"에만 오로지,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신학 대전"(Summa Theologiae)의 가르침에 따라, 정(passions)들에 총 11가지가 있음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상, 발췌 및 유관 부분의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1: 이어지는 제2항에서는, 위의 각주들에서 지적한 바들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료 분석
2-0. 다음은 윤기(尹愭, 1741-1826년, 호는 無名子)가 저자인 "무명자집"에서 발췌한 바인데, 바로 위의 제1-2항에 발췌된 중용책에 제시된 임금 정조의 질문은, 다산이 1785년 경에 태학(즉, 성균관)에 입학한 후에 임금 정조의 질문들에 대하여 이벽 성조의 도움을 받아 답한 시점에 제시되었던 임금 정조의 다수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중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1789년 봄에 과거에 급제한 후에 곧바로 초계문신으로 임명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안에 포함되는 시점인, 특히 1791년 11월 12일 이전의 시점인, 1790년 12월(庚戌十二月)이었음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합니다:
2-0-1. 이를 위하여, 다음의 한국고전종함DB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검색창에 "經文不言心不論氣何歟" 을 입력하면, 임금 정조의 중용에 질문에 대한 답변인 중용책들로서, 그 호가 무명자인 윤기의 답변과 다산의 답변 두 개가 검색됩니다:
http://db.itkc.or.kr/ <---- 여기를 클릭한 후에 "經文不言心不論氣何歟"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하도록 하라
(발췌 시작) [中庸] 庚戌十二月泮儒應製 a256_378a
王若曰。中庸子思之書也。千聖相傳之心法。全體大用備矣。其精微蘊奧。可得而聞歟。天命之性。開卷第一義。而人物之五常同異。爲大疑案何歟。戒愼恐懼。爲學大頭腦。而動靜之通貫與否。作一爭端何歟。性也道也敎也卽三綱。而第二節獨言道字。喜也怒也哀也樂也愛也惡也欲也卽七情。而第四節只擧四者何歟。未發則性。已發則情。統之者心。中者大本。和者達道。發之者氣。而經文不言心不論氣何歟。 (이상, 발췌 끝)
2-0-2. 그리고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는, 다음의 논문[제목: 정조 시대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의 명암(明暗); 저자: 심경호], 제61쪽에서 발췌한 바가 또한 뒷받침 합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62-1836_정약용/2017_심경호_정조시대_초계문신_제도의_명암.pdf (발췌 시작)
(이상, 발췌 끝)
2-0-3. 그런데, 다음에 발췌된 바는, 임금 정조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무명자 윤지의 답변인데, 다산의 답변과 정밀하게 비교/검토를 해보는 것이 다산의 답변이 얼마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윤지의 답변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발췌 시작) 喜怒哀樂愛惡欲。乃人之七情。而第四節之只擧四者。豈非以七情言之。則七者缺一不可。而以未發已發言之。則四者可以包得那三者耶。
희(喜), 노(怒), 애(哀), 락(樂), 애(愛), 오(惡), 욕(欲)은 인간의 칠정(七情)들인데, 그런데 [중용의] 제4절에서 [이들 중의] 네 가지만을 오로지 나열한 것은, 칠정(七情)들로써 이들을 말하면 일곱 개의 정들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는 것이 불가하지만, 그러나 미발(未發)과 이발(已發)로써 말한다면 네 가지 정들이 저들(那, those)[나머지] 셋들을 포괄하여(包) 얻을(得)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豈非)?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그런데 위의 답변은, 많이 부족한 일천(日淺)한 필자가 생각하더라도, 질문을 제시한 임금 정조에게, 답변 대신에, 성리학의 사고의 틀 안에만 오로지 머물러 있으면서 모호한 추측성 질문을 답변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참으로 우답(愚答)이라 아니 말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어지는 글들에서 제시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답변은, 성리학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天學"(천학), 즉, "天主學"(천주학)이라는 성리학보다 더 포괄적이고 차원이 더 높은 관점에서 임금 정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2-1. 다음은, 칠정(七情, seven passions)들이라고 불리는 일곱 개의 정(passions)들의 원 출처인 "예기", 예운편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s://ctext.org/liji/li-yun?searchu=%E4%B8%83%E6%83%85&searchmode=showall#result (발췌 시작) 故聖人耐以天下為一家,以中國為一人者,非意之也,必知其情,辟於其義,明於其利,達於其患,然後能為之。何謂人情?喜怒哀懼愛惡欲七者,弗學而能。何謂人義?父慈、子孝、兄良、弟弟、夫義、婦聽、長惠、幼順、君仁、臣忠十者,謂之人義。講信修睦,謂之人利。爭奪相殺,謂之人患。故聖人所以治人七情,修十義,講信修睦,尚辭讓,去爭奪,舍禮何以治之?
Therefore when it is said that (the ruler being) a sage can look on all under the sky as one family, and on all in the Middle states as one man, this does not mean that he will do so on premeditation and purpose. He must know men's feelings, lay open to them what they consider right, show clearly to them what is advantageous, and comprehend what are their calamities. Being so furnished, he is then able to effect the thing. What are the feelings(*1) of men? They are joy, anger, sadness, fear, love, disliking(*2), and liking(*3). These seven feelings belong to men without their learning them. What are 'the things which men consider right?' Kindness on the part of the father, and filial duty on that of the son; gentleness on the part of the elder brother, and obedience on that of the younger; righteousness on the part of the husband, and submission on that of the wife; kindness on the part of elders, and deference on that of juniors; with benevolence on the part of the ruler, and loyalty on that of the minister - these ten are the things which men consider to be right. Truthfulness in speech and the cultivation of harmony constitute what are called 'the things advantageous to men.' Quarrels, plundering, and murders are 'the things disastrous to men.' Hence, when a sage (ruler) would regulate the seven feelings of men, cultivate the ten virtues that are right; promote truthfulness of speech, and the maintenance of harmony; show his value for kindly consideration and complaisant courtesy; and put away quarrelling and plundering, if he neglect the rules of propriety, how shall he succeed?
----- (*1) 게시자 주: 여기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면 알 수 있는 자연적 개념(natural concept)을 나타내는 "情"이 "feeling"(느낌)으로 번역된 것은 번역 오류인데, 이 오류는 번역자 James Legge(1815-1897년)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대응하는 고유한 윤리 신학 용어인,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한 인간의 욕구(a human appetite)의 격렬한 동요(動搖, motion, 움직임)"을 말하는, "passsion"를 선택하는 대신에, "feeling"(느낌)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적에 대한 더 자세한 졸글들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95.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98.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307.htm
(*2) 게시자 주: 여기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면 알 수 있는 개념, 즉, 자연적 개념(natural concept)을 나타내는 "惡"이 "disliking"으로 번역된 것은 번역 오류인데, 이 오류는 번역자 James Legge(1815-1897년)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대응하는 고유한 윤리 신학 용어인, "love"의 반대어인, "hatred"를 선택하는 대신에, "disliking"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적에 대한 더 자세한 졸글들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95.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98.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307.htm
(*3) 게시자 주: 여기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면 알 수 있는 개념, 즉, 자연적 개념(natural concept)을 나타내는 "欲"이 "liking"으로 번역된 것은 번역 오류인데, 이 오류는 번역자 James Legge(1815-1897년)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대응하는 고유한 윤리 신학 용어인, "aversion"(避, 혐오함)을 그 대응하는 반대 개념으로 가지는, "desire"(욕망함)를 선택하는 대신에, "liking"(좋아함)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적에 대한 더 자세한 졸글들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95.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98.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307.htm ----- (이상, 발췌 끝)
그런데, 임금 정조의 질문 중에서 "喜怒哀樂愛惡 卽七情"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섯 개의 낱글자들 "喜、怒、哀、樂、愛、惡、欲"의 출처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荀子)의 "正名"(정명)인데, 그러나 여기서 순자는 이들 일곱을 두고서 "七情"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음에 또한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췌 시작) 然則何緣而以同異?曰:緣天官。凡同類同情者,其天官之意物也同。故比方之疑似而通,是所以共其約名以相期也。形體、色理以目異;聲音清濁、調竽、奇聲以耳異;甘、苦、鹹、淡、辛、酸、奇味以口異;香、臭、芬、鬱、腥、臊、漏庮、奇臭以鼻異;疾、癢、凔、熱、滑、鈹、輕、重以形體異;說、故、喜、怒、哀、樂、愛、惡、欲以心異。心有徵知。徵知,則緣耳而知聲可也,緣目而知形可也。然而徵知必將待天官之當簿其類,然後可也。五官簿之而不知,心徵知而無說,則人莫不然謂之不知。此所緣而以同異也。 (이상, 발췌 끝)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자신의 답변글에서 순자의 "정명"에 나열된 바를 두고서 "七情"들이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i) 순자 자신이 이들을 "七情"들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더 나아가, (ii) "정명"에 나열된 바에서 "喜"와 "樂"이 자구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낱글자들임을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내용 수정 및 추가 일자: 2020년 11월 3일] 게시자 주 2-1: (1)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 또한 제시된 영어 번역문은, 1839년에 [지금의 말레이시아 나라의] 말라카(Malacca)로 선교사로 파견되었으며, 말라카에서 이후 3년간 머문 뒤에, 1843년부터 홍콩에 오랜 기간 머물렀던, 개신교회측 선교사였던 James Legge(1815-1897년)에 의하여 번역된 것이다.
(2) 그리고 이 선교사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즉, 1807년경에 중국 본토에 처음으로 도착한 후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한 개신교회측 최초의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814-1843년)의 아들인, John Robert Morrison(J. R. Morrison, 馬儒翰, 1814.04.17-1843.08.29) 그리고 또다른 개신교회측 선교사였던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etlaff, 1803-1851년) 등이 1839년경에, 이들 개신교회용 신,구약 성경의 개정본을 마련할 때에 James Legge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영국을 떠난 해인 1839년 어느 날 영국에서 결혼한 James Legge의 첫 아내 Mary는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의 친딸이었다.
James Legge는, 홍콩에 도착한 1843년 이후에, 영국 런던 선교회 측에 의하여 중국에 파견된, 동료 및 선배 선교사들에게 "God"를 "상제"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고 또 그의 바로 이 견해는 이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으며 그 결과로, 영국 런던 선교회 측에 의하여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인 Medhurst, Milne, Stronach 등이, 1850년 8월 1일 이후에, 로버트 모리슨의 구약 성경을 별도로 개정 번역할 당시의 정규 독회에 James Legge를 불러 함께 번역 작업에 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마련한 개신교회용 한문본 구약 성경의 문체(style)에는 James Legge의 개인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었으며, 따라서, 특히 바로 이 "구약 성경"은, 당시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미국 개신교회 측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직역 번역이라기 보다는 수용 불가한 정도의 의역 번역이라고 이해되어, 배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 게시자 주: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James Legge의 생애 전반과 그의 저술 작업 등에 대한 정보들을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15-1897_James_Legge/intro2James_Legge.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15-1897_James_Legge/LeggeBookBowman.pdf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15-1897_James_Legge/Lau1994.pdf
그리고 송강호의 책 "중국어 성경과 번역의 역사"의 제148쪽부터 읽도록 하라. ----- [이상, 2020년 11월 3일자 내용 수정 및 추가 끝]
(3) 또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한 후에 게시자 주 2-3-7을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11.htm <----- 바쁘지 않은 분들의 필독 권고 (이상, 게시자 주 2-1 끝)
2-2.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가지게 되는 "천주실의", 권하 화면에서, "愧" "悔" "忮" "恨" 각 낱글자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면, 이들 네 개의 낱글자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ctext.org/wiki.pl?if=en&chapter=938302 "愧" "悔" "忮" "恨" "耶穌會文獻匯編" site:ctext.org (발췌 시작) 주: 다음의 단락은 "천주실의", 권하, 제5편 본문 중에 있음: https://ctext.org/wiki.pl?if=en&chapter=938302&searchu=%E6%84%A7 https://ctext.org/wiki.pl?if=en&chapter=938302&searchu=%E6%82%94 112 君子雖已遷善,豈恬然於往所得罪乎?曩者所為不善,人或赦,弗追究,而己時記之,愧之,悔之。設無深悔,吾所既失於前,烏可望免之於後也?
주: 다음의 단락은 "천주실의", 권하, 제6편 본문 중에 있음: https://ctext.org/wiki.pl?if=en&chapter=938302&searchu=%E5%BF%AE 181 『意者』心之發也,金石草木無心,則無意。故鏌鎁傷人,複仇者不折鏌鎁;飄瓦損人首,忮心者不怨飄瓦。然鏌鎁截斷,無與其功者;瓦蔽風雨,民無酬謝。所為無心無意,是以無德無慝、無善無惡,而無可以賞罰之。
주: 다음의 단락은 "천주실의", 권하, 제7편 본문 중에 있음: https://ctext.org/wiki.pl?if=en&chapter=938302&searchu=%E6%81%A8 492 其善也,吾以司愛者愛之、欲之;其惡也,吾以司愛者惡之、恨之。蓋『司明者』,達是又達非,『司愛者』,司善善又司惡惡者也。三司已成,吾無事不成矣。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2-2: (1) 위의 제1-2항에 발췌된 바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그 진위 여부의 구체적인 제시 없이 "愧" "悔" "忮" "恨" 이들 네 개의 낱글자들이 나타내는 개념들이 일곱 개의 정(七情)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claim),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러한 주장을 하기 이전에,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저서로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신학 대전"(Summa Theologiae)의 가르침에 따라 정(passions)들에 총 11가지가 있음을, 유학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수신서학"을 이미 입수하여 학습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생각이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785년에 발생한, 소위 말하는 을사추조적발 사건으로 인하여, 중용책에서 한문본 천주교 문헌 어느 것도 중용책 본문에서 그 출처 문헌으로서 제시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심지어 "사고전서"에 포함된 "천주실의", 권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愧" "悔" "忮" "恨" 이들 네 개의 낱글자들을 찾아서, 궁여지책으로, 제시하면서도 그러나, 을사추조적발 사건의 결과라는 마찬가지 이유로, 이들에 대한 출처 문헌이 "천주실의", 권하 임을 중용책 본문 중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다.
(3)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즉, 바로 위의 제(1)항과 제(2)항에서 지적한 바의 반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특히 우연적으로(accidentally), "예기", 예운 중에 처음 등장하는 일곱 개의 정(七情)들에다 "천주실의", 권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愧" "悔" "忮" "恨" 네 개의 낱글자들이 나타내는 개념들만을 오로지 추가하여, 중용책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총 11개의 정(情, passions)들을 처음으로/독창적으로 나열할 수 없었을 것임에, 반드시 주목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대체 어느 누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천주실의", 권하의 본문을 철저하게 뒤져서, 특정한 한 개의 주제 아래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우연적으로(accidentally) 흩어져 있는 이들 네 개의 낱글자들을 자신의 주장(claim)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제시할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었겠는지요???
(4) 또다른 한편으로, 학문적으로 바로 위의 제(3)항에서 지적한 바와 관련하여,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졸글[제목: 천주실의 의 내용 이해를 위한 필독서들에는 수신서학 이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8년 1월 2일]을 또한 꼭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84.htm <----- 필독 권고 (이상, 게시자 주 2-2 끝)
2-3.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저서로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신학 대전"(Summa Theologiae)의 가르침에 따라 정(passions)들에 총 11가지가 있음을, 유학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수신서학" 중의 유관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81.htm <---- 여기를 클릭하여 전문을 꼭 읽도록 하라 (발췌 시작) 3-3.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위의 게시자 주 3-1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情, passion)의 11개의 종(種)적 개념들 각각이, 예를 들어,
(i) "愛"이 "愛情"로 표기되고, (ii)"欲"이 "欲情"로 표기되고, 그리고 (iii) "惡"이 "惡情"로 표기되는 등, 해당 낱글자에 情 낱글자를 추가하여 부르면서, 또한, 이들 용어들이 나타내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년)의 "신학 대전", Ia IIae, q23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 문헌이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의 저서로서 1630년 혹은 그 이전에 저술된, "수신서학", 권4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66-1640_알퐁소_바뇨니/1630_수신서학.htm (발췌 시작) 수신서학_권4_1_혈기2사(concupiscible_faculty_&_irascible_faculty)지정하_34-35 [卷四記述諸情,司欲之情有六,即愛、欲、樂、惡、避、憂,司岔之情有五,即望、失志、懼、敢、怒。(졸번역) 권4는 여러 정(情, passions)들을 기술하는데, 사욕(司欲)[concupiscible faculty, 사욕(私欲), 즉, 사욕편정(私慾偏情)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되는 능력]의 정(情, passions)들에는 여섯이 있는 즉, 애(愛, love), 욕(欲, desire), 락(樂, joy or pleasure), 오(惡, hatred), 피(避, aversion), 우(憂, sadness) 이고, 그리고 사분(司岔)[irascible faculty, 분발(奮發)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능력]의 정(情, passions)들에는 다섯이 있는 즉, 망(望, hope), 실지[失志, 즉, 절망(dispair)], 구(懼, fear), 감(敢, daring), 노(怒, anger) 임. (이상, 졸번역 끝)]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3-3: (1) (이 글의 결론 3)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여,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의 저서로서 1630년 혹은 그 이전에 초간된 것으로 알려진, "수신서학" 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년)의 "신학 대전", Ia IIae, q23에 따라, 11개의 정(情, passion)들 사이의 유관 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한문본 문헌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2) 위의 주소들에서, 예기(禮記)에서 나열된 칠정(七情, 즉, 喜怒哀懼愛惡欲)들 각각은, 필자에 의하여,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3) 그런데, 7죄종(seven capital vices)들 중에서, 분노(anger)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죄의 우두머리들에 대하여는 "수신서학"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칠죄종(seven capital vices)들이, (i)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의 저서로서 1615년에 초간된 것으로 알려진 "교요해략"에서 이미 간략하게 서술되었고, 그리고 또한 (ii) 판토하 신부님(1571-1618년)의 저서로서 1614년에 초간된 "칠극"에서, 이들이 어떠한 덕(virtues)들로써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쉽게 그리고 상세하게 서술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이상, 발췌 끝)
3. 이 글의 결론들
지금까지 위의 제1항과 제2항에서 고찰한 바로부터, 다음의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3-1. (이 글의 결론 1) 위의 제2-2항에서 고찰한 바로부터, 마태오 리치 신부님의 "천주실의", 권하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중용책의 자구 출처 문헌들 중에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2. (이 글의 결론 2) 위의 제2-2항과 제2-3항에서 고찰한 바로부터, 아무리 늦더라도, 1790년 말에 이르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의 저서로서 1630년 혹은 그 이전에 저술된, "수신서학"을 입수하여 이미 학습하셨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3-2: (1) 그렇지 않고서는, 즉, 바로 위의 제(1)항과 제(2)항에서 지적한 바의 반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특히 우연적으로(accidentally), "예기", 예운 중에 처음 등장하는 일곱 개의 정(七情)들에다 "천주실의", 권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愧" "悔" "忮" "恨" 네 개의 낱글자들이 나타내는 개념들만을 오로지 추가하여, 중용책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총 11개의 정(情, passions)들을 처음으로/독창적으로 나열할 수 없었을 것임에, 반드시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누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천주실의", 권하의 본문을 철저하게 뒤져서, 특정한 한 개의 주제 아래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우연적으로(accidentally) 흩어져 있는 이들 네 개의 낱글자들을 자신의 주장(claim)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제시할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었겠는지요???
(2) 다른 한편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1785년에 발생한 을사추조적발 사건 이전의 시점에, 학문적 스승이기도 한, 이벽 성조(1754-1785년)로부터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인 "수신서학"을 입수하여 학습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문헌적 증거는 필자가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게시자 주 3-2 끝)
3-3. (이 글의 결론 3)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위의 제2-0-3항에 발췌된 바인 무명자 윤기의 답변에서처럼, "七情"들이란 "喜、怒、哀、樂、愛、惡、欲"을 말한다고 답변하지 아니한 이유는,
(i) 순자 자신이 "정명"에서 이들을 "七情"들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ii) "정명"에 나열된 바에서 "喜"와 "樂"이 자구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낱글자들임을 다산께서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며, 특히, 그리고 더 나아가, (iii) 다산께서 임금 정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중용책을 마련할 당시 이전에 이미 초계 문신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결과, 바로 위의 제(ii)항의 자구적 사실을 또한 수용(受容)하고 있는,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의 "수신서학"을, [궁궐 내에 위치한] 내규장각 혹은 [강화도에 위치한] 외규장각으로부터, 입수하여 이미 학습하셨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그 결과,
(A) 총 열한 개의 "정(情, passions)"들이 있음을, 아무리 늦더라도, 중용책을 마련하기 전인, 1790년 12월에 이르면, 이미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 결과 (B) 위의 제2-2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용책 답변을 임금 정조에게 제시할 수 있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 (*) 게시자 주: (1)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1782년 이전에 "수신서학"이 외규장각 장서 목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증/입증하는 논문들을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66-1640_알퐁소_바뇨니/1630_수신서학.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84.htm
(2) 특히, "喜"와 "樂"이 자구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낱글자들임 수용한, 따라서, "예기"에 나열된 "七情"(seven passions)들의 목록을 수용한,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바에서 발췌한, 다음에 발췌된 바를 정밀하게 읽도록 하라: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66-1640_알퐁소_바뇨니/1630_수신서학.htm (발췌 시작) 수신서학_권4_5_락정(joy_or_pleasure)본말_38-40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락, 기(嗜), 애욕, 호미, 자(自), 의(宐), 안락지정, 4원, 안락자, 조밍(兆民), 중정, 무각지물, 지각지물, 안?, 영신지락(the joy of the soul), 형신지락(the pelasure of the body), 영재(靈才, intellect's faculties/powers), 진실, 청계(淸溪), 합성, 통심, 형사각, 위, 탁, 허, 단, 신락(spirit's joy), 인심, 신락(body's pleasure), 애욕호미자, 선락, 추락, 조물주, 정락, 군자, 성정, 사욕, 사락, 정도] (이상, 발췌 끝)
(3)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인 "수신서학"이 다산의 성기호설의 출처 문헌들에 포함됨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졸글을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92.htm <----- 필독 권고 -----
3-4. 위의 (이 글의 결론 1), (이 글의 결론 2), 그리고 (이 글의 결론 3)의 한 개의 따름정리(a corollary)로서, 다음의 결론을 또한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4) 위의 제1-2항에 발췌된 바로 이러한 답변 당시인 1790년 12월의 다산의 사고/마음의 틀(the frame of thought/mind)은, 자연법(natural law)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성리학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天學"(천학), 즉, "天主學"(천주학)이라는 성리학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사고/마음의 틀로 이미 확장(擴張)되어 있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 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0 28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