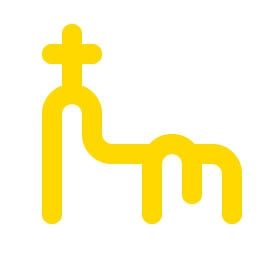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 평화신문 연재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그 후 (2) 가난한 이들과 함께 못해...용기가 없어서 |
|---|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그 후 2] 가난한 이들과 함께 못해... 용기가 없어서
<사진설명>
'가난한 이들의 벗' 김수환 추기경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한다. 사진은 1990년 서울 용산 베들레헴의 집에 찾아가 성탄 밤미사를 봉헌하는 모습.
서울대교구장직에서 물러나고 두어 달 지났을 때다.
특강 요청을 받고 전남 순천에 내려간 길에 잠깐 짬을 내서 소록도에 들렀다. 소록도에 살고 있는 나환우 200여명과 미사를 봉헌한 뒤 그들의 뭉그러진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내 어찌 그들 가슴에 맺힌 한과 설움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펴놓고 복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 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이사 53, 4-7).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어느 누군가의 고통과 불행이 전제된 것이다. 군인들이 밤새 보초를 서주는 덕분에 국민들이 남북대치 상황에서도 두 발 뻗고 편히 자는 것처럼 말이다. 이 지구상 한편에서 비만을 걱정하고, 다른 한편에서 굶주림을 걱정하는 모순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형(天刑)이라 불리는 한센병에 신음하는 나환우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나는 특히 나환우를 비롯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빚진 게 많은 사람이다. 남들보다 그들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얘기했음에도 실상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자주 껴안아주지 못했다.
이승의 삶을 마감하고 하느님 앞에 서는 날, 가장 호되게 꾸지람을 들을 죄가 아닐까 싶다.
성직자로서 그동안 그들에게 보여준 내 사랑은 43년 동안 소록도 나환우들을 보살피다 2005년 늦가을 홀연히 떠난 마리안느(Marianne Stoeger) 수녀와 마가렛(Margreth Pissarek) 수녀의 그것에 비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수녀는 28살 젊은 나이에 소록도에 들어가 한평생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환영받는 자리는 피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실천했다. 그것도 부족해 나환우들에게 이별의 아픔을 안겨주기 싫어서 이른 아침에 도망치듯 섬에서 빠져나와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참 사랑은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수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사랑은 클 때 행동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은 진실할 때 하느님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난 행동으로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날 나환우를 대표해 앞에 선 전종선(베네딕토) 사목회장이 "멀고 험한 이곳을 네 번이나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 인사를 받기가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 손사래를 쳤다.
'고맙다니요? 네 번이 아니라 마흔 번을 찾아와도 부족했을 겁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장례미사를 주례한 빈민운동가 제정구(바오로, 1999년 2월 9일 타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1970년대 초반부터 예수회 정일우 신부님과 함께 양평동 둑방동네 철거민촌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 같은 사람은 흉내조차 낼 수 없다.
서울대 제적생이었던 그는 철거민들을 '위해(for)' 산 것이 아니라 '함께(with)' 살았다. 그와 정 신부님은 작은 옷장 하나 들여놓을 공간이 없는 '게딱지' 같은 방에서 지내고, 한겨울이면 얼어붙은 배설물이 엉덩이를 찌른다는 공중변소를 이용하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했다. 내가 머물던 명동 주교관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난 두 사람이 청계천 판자촌에서 살 때부터 인연을 맺고 심심찮게 만났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주는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미력하나마 힘이 돼주려고 했다.
어느 날인가 두 사람이 "빨갱이로 몰려 공안기관에 붙들려가면 발표해 달라"며 양심선언서를 써갖고 왔다. 사연인 즉, 담당 형사가 빈민운동에 투신한 두 사람을 빨갱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침투해 철거민들을 포섭하고 있다나.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지만 미국인인 정 신부님(본명 존 빈센트 데일리)은 CIA 요원(어떨 때는 소련 스파이)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하기는 시위 잘하는 젊은이와 미국에서 온 신부가 철거민촌에 들어가 주민들과 숙덕숙덕하고 있으니 공안기관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의주시하는 것은 당연했는지 모른다.
1976년 성탄절을 보낸 뒤 모처럼 철거민촌에 들렀다, 두 사람은 "기한까지 못박은 철거 계고장이 날아왔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도울만한 일이 없냐고 묻자 대뜸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 땅을 사서 집단이주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추기경이라고 해도 170여가구가 이주할 부지 구입비를 어디서 끌어다 준단 말인가? 궁리 끝에 독일 원조단체 앞으로 지원 추천서를 써줬더니 정 신부님이 그걸 갖고 가서 용케 돈을 얻어 오셨다.
하지만 쓸 만한 땅은 전부 힘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내놓지를 않아 무척 애를 먹었다. 그래서 내가 힘께나 쓴다는 중앙정보부 아무개씨에게 시쳇말로 '빽'을 좀 썼더니 며칠 만에 문제가 해결됐다. 아무개씨가 그 뒤에도 성의껏 행정적 편의를 봐준 게 고마워 철거민들이 복음자리(경기도 시흥시 신천리)에 입주하는 날 내 이름으로 그에게 표창장을 줬다. 그동안 내 명의로 수많은 곳에 표창장을 전달했지만 정보기관쪽에 그런 걸 건넨 것은 처음이다. 나를 감시, 견제하는 기관에 소속된 인사에게 상을 주는 게 모양새가 어색해 내 도장을 찍지 않고 이름만 넣었지만 말이다.
두 사람은 복음자리에 내 방을 하나 마련해 줬다. 그곳에 여러 번 갔지만 자고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공동화장실 이용부터 시작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자고 가라고 손을 잡아 끌 때마다 "바쁜 일이 있어서"라며 꽁무니를 뺐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는데….
난 대구에서 신부 생활을 할 때 희망원이란 복지시설을 들락거리면서 행려자와 장애인들 속으로 투신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그러나 머뭇거리기만 하다 주교로 임명됐다.
가난한 이들과 살고 싶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주교나 추기경이란 직책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용기가 없어서였음을 고백한다.
[평화신문, 제921호(2007년 5월 20일), 정리=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