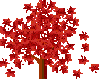암사동성당 게시판
|
가톨릭다이제스트에 자매님글이 |
|---|
|
"엄마의 엉덩이"라는 제목을 달고 가톨릭 다이제스트에 장영옥 자매님의 글이 실려 있어서 옮겨 봅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엄마 생각이 울컥 했어요 조금씩 느낌은 다르겠지만 , 엄마에 대한 각자의 그리움을 느껴보시면 어떨런지요........
- - -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였다. 갓 들인 지금은 손끝이 온통 벌겋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손톱에는 고운 반달이 뜰게다. "고와지겠지......" 손을 쫙 펴서 손끝을 본다. 문득 엄마 생각이난다. 오이깍두기를 좋아하시던 엄마. 여름밤 마당에 펴놓은 멍석 위에서 두런두런 귀신 이야기를 하다가 무서움이 솟구쳐 달려가면 암탉이 병아리 품듯 품어 주시던 엄마.
여름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 쌀이 드문드문 박힌 보리밥을 큰 양픈에 내오신 어머니가 밭에서 금방 딴 늙은 오이로 만든 생채를 얹고, 고추장을 듬뿍넣어 쓱쓱 비비면 우리 아홉남매는 눈을 빛내며 달려든다. 한손에는 고추장을 찍은 풋고추를 들고....
가끔은 근처 바닷가에서 갓 잡아온 싸락맛을 넣고 칼국수를 해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큰 자배기에 담아 마당으로 내오면 우리는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다닥다닥 붙어 앉는다. 꼭 흥부네처럼 -
겨울에도 우리 입성은 광목 치마저고리가 고작이었다. 그래도 추운줄 모르고 눈사람도 만들고 고드름도 따먹으며 뛰어다녔다. 썰매를 타다 엉덩방아를 찧어도 툭툭 텰고 일어나면 그만이던 시절 ! 엄마 말대로 "아이와 장독은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것" 인지 그 어렵던 시절에 어머니는 아홉 남매를 낳아 기르셨다
나는 유난히 엄마를 따라 다녔다. 아버지는 아들인 동생만 챙기실 뿐 딸이 많은 집안 끝자락에 딸린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기에 엄마 옆자리는 으레 내 차지였다. 흥부네처럼 조랑조랑 열린 아홉 남매를 위해 어머니는 한겨울에도 요 한자락 깔고 누울 수 없었고 밤새 아홉 자식이 서로 끌어당겨 덮는 이불을 단속하시느라 제대로 주무실 수도 없었다.
어느 날인가 그날도 여느날처럼 나는 엄마 옆에 누웠고 버릇처럼 엄마를 만졌다. 젖가슴을 만졌고 ,축 처져 주름이 겹쳐지는 배를 주물럭거리며 아스라하게 잠에 빠져들려던 참이었다. 내 손이 엄마 엉덩이에 닿았나보다. "아함 엄마 엄마 엉덩이는 왜 이렇게 딱딱해 ?" -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
그때만 해도 엄마들 엉덩이는 다 그런 줄 알았다. 그 딱딱한 부분을 만지작거리는 재미도 쏠쏠했기에.....
이제 내 나이 쉰 , 나역시 아이들을 키웠고 그때 엄마 나이가 됐는데 내 엉덩이에는 굳은살이 없다. 그리고 지금에야 깨닫는다 그건 아홉자식을 제대로 재우시려고 그 자식들이 다 자랄 때까지 당신은 맨바닥에서 주무시느라 생긴 흔적이었음을........
"얼마나 아프셨을까 " ! 지난해 어머니는 87세를 일기로 이승을 떠나셨다.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해서인지 어머니는 늘그막에 병치레를 많이 하셨다. 쪼그맣게 쪼그라든 몸으로 통증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주물러드리며 나는 무척이나 울었다.
한때는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 어머니 엉덩이의 굳은살이 내 마음을 저미는 듯해서 말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