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성당 장년게시판
|
거꾸로 가며 찐하게 살기 |
|---|
|
치밀하게 계획된 내 꼬드김에 몸을 맡긴 세 아낙네와 함께.
월악나루에서 제천까지 호수와 산으로 잘 어우러진 그림 속을 걷다 온 지금, 모든 것이 잘 마련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오.
잠자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마을에 수련원으로 꾸민 폐교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음악을 하는 그 집 아들이 가이드를 자청해 일정에 없던 곳을 구경시켜 준 것도 예사롭지 않고... 우리와 함께 누운 첼로 덕에 눅눅한 이불에 쿰쿰한 냄새가 나는 방은 담박 낭만적인 여행지로 바뀌어, 맑아만 가는 눈으로 바라본 천장엔 류시화가 인도 여행 중 천막 사이로 보았던 별이 보이는 듯했다오.
20km를 넘게 걸은 둘쨋날, 따순 물에 몸을 푹 담가 보겠다고 찾아간 모텔은 왜 그리 낯선지... 비를 긋는 동안 차로 모텔을 빠져나가는 부적절한 관계임이 분명한 남녀 두 쌍을 보곤 만정이 떨어져 무작정 뛰쳐나오고 말았소. 그런데 ’왕건’ 촬영장 부근 통나무 집에 뽀송뽀송한 황토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우리 여행길에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넉넉하게 본 것은 이름 모르는 숱한 들꽃이었소.
애기똥풀을 기억하오? 어린 시절 손톱을 노랗게 물들이던 꽃 말이오. 일부러 가꾼 서양꽃보다 더 애잔하게 무리져 피어 있습디다.
향기가 없어 벌을 부르지 않는 엉겅퀴 -도도한 성품이 맘에 들어 내가 좋아하는 꽃-는 서울 근교에서 어쩌다 보면 키만 껑충하게 큰 게 꽃송이가 볼품없는데 여기서는 보랏빛 송이가 탱탱한 밤송이 같구려. 혹시 싶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니 이슬 냄새만 얼핏 묻어 있는 듯 하더이다.
산길엔 싸리꽃도 한창입디다. 싸리나무라면... ’태백산맥’에서 소화가 情人을 숨겨 주며 연기가 나지 않게 불을 지필 때 쓴 나무 아니오? 강원도로 이어지는 산골이니 그럴 법도 하겠다 싶더이다.
청풍에서 제천 가는 길엔 할미꽃이 지천인데 내가 반가워 이름을 소리내니 모두들 처음 본다며 신기해 하더이다.
크림색 초롱을 조로록 달고 있는 것은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움이 무수히 피었다 지는 들녘...
우리가 만난 이 땅의 아낙네들은 산길 가다 먹으라며 달걀이랑 거위알도 삶아 주고 비 맞지 말라며 우산이랑 우의도 챙겨 줍디다. 우리 얘기 듣는 재미에 아까운 줄 모르고 감자전도 부쳐 주고 감주도 퍼 주더이다. 남정네에게 길을 물으면 데려다 주지 못해 한을 하더이다. 모든 거리를 ’금방’이라는 한 마디 말로 설명하는 게 흠이라면 흠일까? 전유성 말마따나 지들이 우리 말로 물어봐 우리가 왜 대답을 안 해? 되지 않게 꼬부랑 말로 물으니 그렇지.
지금 와 생각하면 무리하지 않는다고 힘을 아낀 게 오히려 안타깝소. 다녀와서 이틀은 꿈 속을 헤맬 만큼 곤해야 더 뿌듯했을 터인데...
자동차로 잠깐이면 가는 길을 사흘에 걸쳐 힘써 걸으면서 사는 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거듭 했소. 거꾸로 가는 삶에 도전하려는 열정이 있는 내가 조금은 대견스럽고...
"엄만 왜 고생을 사서 하우" 하는 아로미, 엄마 이해하는 날 곧 오겠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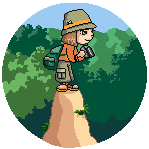 나 기어이 도보여행 다녀왔소.
나 기어이 도보여행 다녀왔소.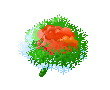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다가 정선 아리랑을 구성지게 불러 보아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 산길...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다가 정선 아리랑을 구성지게 불러 보아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 산길...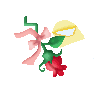 언놈이 우리 나라 사람을 불친절하고 성을 잘 낸다 하였소?
언놈이 우리 나라 사람을 불친절하고 성을 잘 낸다 하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