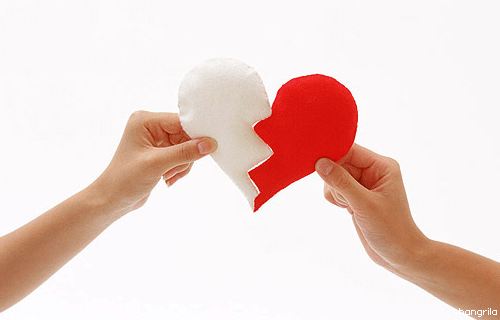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철도파업에 대한 지지
대기업 성토와 입사 열망, 중소기업 육성 지지하면서 외면
새해에는 사실 존중하고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판단력 갖추기를
철도노조의 파업을 멈추게 한 것은 국민의 싸늘한 반응이었다. 상당한 액수의 연봉에 ‘자동 승진’ ‘비연고 지역 배치 불가’ 등 어느 회사보다도 월등한 근무조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과거의 가난한 철도노동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평균 5700억 원에 이르는 코레일의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요금이 수십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민영화 괴담’도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철도노조 위원장이 수시로 꺼낸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말은 국민의 반감만 자극했다.
이번 파업의 결말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20, 30대는 65%의 응답자가 “철도파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영화 반대’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수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는 현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조치는 민영화가 아니라 내부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80%가 대학 진학자인 젊은 세대가 이 정도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은 ‘민영화 반대’ 구호에 등을 돌렸고, 철도노조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응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번 파업을 주도한 진보 진영의 논리에 젊은 세대가 무조건 동조하고 편승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민영화라는 단어가 상기시키는 ‘무한 경쟁’의 세태에 대한 거부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거대한 철옹성’이 되어 버린 공기업 노조의 기득권 수호 시위에, 가진 것 별로 없는 취업준비생들이 심각한 표정이 되어 편을 드는 것은 기막힌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젊은 세대의 이율배반은 프로야구와 대중문화 열풍에서도 나타난다. 얼마 전 찾았던 프로야구 경기장은 20, 30대로 가득 차 있었다. 연간 700만 명 안팎의 관중을 끌어들이는 프로야구 시장은 젊은 세대가 주요 고객이다. 20세기 들어 본격화한 관전 스포츠와 문화산업은 대표적인 승자독식의 세계다. 지난해 말에도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프로야구 선수들이 1인당 최고 75억 원의 수입을 확보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반면 훨씬 많은 선수가 시즌 뒤 퇴출되어 쓸쓸히 그라운드를 떠났다. 영화 한 편 출연에 수십억 원을 받는 인기 스타들의 뒤편에는 월 100만 원을 받으며 밤을 새우는 다수의 영화 종사자가 있다. 젊은 세대가 진보적 시각에서 자본주의 방식의 경쟁을 싫어하고 죄악시한다면 이를 경계하고 외면해야 앞뒤가 맞아 보이지만 정반대로 누구보다 열광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전통시장 살리기를 강조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드러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외국계 대형마트를 표적 삼아 위반 사항을 샅샅이 뒤지기도 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진보 진영에 상당한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옛 추억에 젖어 이따금 가보는 전통시장에서는 젊은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나이 든 상인과 중년 이상의 손님들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뿐이다. 반면 대형마트는 20, 30대로 북적거린다. ‘지지 따로 행동 따로’의 위선이다. 어디 그뿐일까. 국회의원 선거 때는 대기업을 옥죄는 진보 후보를 선택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동조하면서도 현실에선 대기업 입사를 갈망하고, 일자리에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젊은 세대가 진보 성향에 기우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이들이 세상사를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저울질하고, 의도가 뻔한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일은 우리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성세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젊은 세대가 잘못을 해도 나무라는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대학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며 등을 두드려 주기에 급급하다. 부모들의 자식 과잉보호는 대학은 물론이고 취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있는 젊은 세대는 ‘불쌍한 청춘’ ‘억압 받는 세대’로 자리매김 됐다. 세계 어디에도 젊은 세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나라는 없다.
젊은 세대에 대한 격려는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격려만으로 끝난다면 기성세대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일깨우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