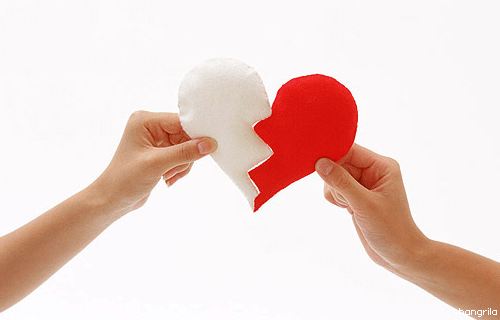(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대성당 뒤편 구석에 조각가 안나 크로미의 ‘빈 외투’ 동상이 앉아 있다. 사람은 없고 빈 외투만 유령처럼 쭈그려 앉은 모습이 섬뜩하다. 웅장한 성당에 가려진 껍데기 신앙을 꾸짖는 것일까.

흥겨운 크리스마스 시즌, 낯선 카멜레온 하나가 서성거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聖子), 구세주, 유대교의 종교개혁자, 신성모독의 사형수, 역사의 종말을 경고한 묵시예언가, 로마에 저항한 독립운동가, 무산계급의 혁명가, 영험 있는 엑소시스트, 권력과 자본가의 변호인…. 예수만큼 드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이름은 달리 없다.
식민지 유대 땅에서의 짧은 생애, 그 몇 마디 말씀과 발자취를 추적하고 해석하기 위해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도서관의 서가들이 그에 관한 저술로 가득 채워져 왔다. 신격화된 인간(불트만), 뛰어난 종교적 선각자의 한 사람(르낭), 역사적 추적이 불가능한 종교설화의 주인공(슈바이처) 등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다양한 신학이론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연인(카잔차키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로마 병사의 사생아(샤버그 『사생아 예수』)처럼 기독교계를 분노로 들쑤셔놓은 픽션도 수없이 많았다.
『21세기 사전』을 쓴 자크 아탈리는 예수에게서 소외계층을 향한 형제애와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지닌 사회 변혁의 열정을 보았지만, 반체제 혁명가에게까지는 시선이 닿지 않았다.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난한 마르크스는 물론 성서를 ‘인류의 이상이 인격화된 신화’라고 해석하는 헤겔 좌파에서도 예수를 급진적 혁명투사로 보지는 않았다. 사회주의 혁명가 예수가 등장한 것은 ‘공산당 선언의 눈으로 성서를 읽은’ 에른스트 블로흐에 의해서다. 성서에서 종말론적 희망의 혁명사상을 발견한 블로흐는 『저항과 반역의 기독교』를 세상에 내놓았다. 또 하나의 성탄절, 이념적 메시아의 탄생이다.
왜곡된 사회구조를 타파하는 해방자 예수를 외치며 아마존 유역의 빈민굴에서 해방신학이 솟아날 무렵,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이 나라에는 민중신학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예수는 개인이 아니라 민중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정치신학자들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민중의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한 흡혈귀 신학의 주술(呪術)이라고까지 극언했다.
오늘 이 땅의 예수는 누구인가. 한쪽에서는 ‘헌금을 바치고 신앙고백을 읊조리기만 하면 마냥 복을 쏟아붓고 죽은 뒤에 천국까지 보장해주는 기복(祈福)의 대상’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의 손에 죽고 민중의 의식 속에 부활한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한다. 이 두 극단의 도그마 사이에서 예수의 이름은 시대와 이념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예수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은 오직 두 개의 나무토막, 태어날 때의 말구유와 죽을 때의 십자가뿐이었다. 그는 초라한 한 칸의 집도, 작은 예배당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군중과 손을 잡지 않았다. 예수의 삶은 마구간에서 시작해 광야를 거쳐 십자가에 이르는 고난의 여정이었다. 메시아의 탄생은 고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한국 교회는 그 고난의 길(Via Dolorosa)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소외된 이웃, 사회의 그늘진 자리를 향한 희생과 헌신 없이 호화로운 강단에서 풍요를 축원하고 안락을 약속하는 교회라면, 가치와 목표를 상실한 혼돈의 시대에 삶의 소망과 실존의 진실을 깨우쳐주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어떤 화려한 옷을 걸친 메시아라 해도 실체 없는 빈 외투의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킨 신학이라면, 사랑과 평화의 사명을 버려둔 채 증오 서린 정치투쟁에 전념하는 종교인이라면, 아무리 신성한 모습으로 치장한다 한들 ‘하나님의 것을 카이사르의 것으로 바꾸는’ 세속권력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토머스 칼라일이 ‘영혼의 평안과 소망이 달려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고백한 이 엄숙한 물음에 한국 교회는 가난한 마음, 고뇌 어린 영혼으로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는지를, 가시관을 쓴 예수의 머리에 부귀의 금관 혹은 권력의 왕관을 덧씌우고 있지 않은지를….
그 대답이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저 또 한 번의 흥청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스쳐 지나갈 따름이다. 몸통은 없이 껍데기만 댕그라니 나앉은 빈 외투의 성탄절이.
이우근 법무법인 충정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