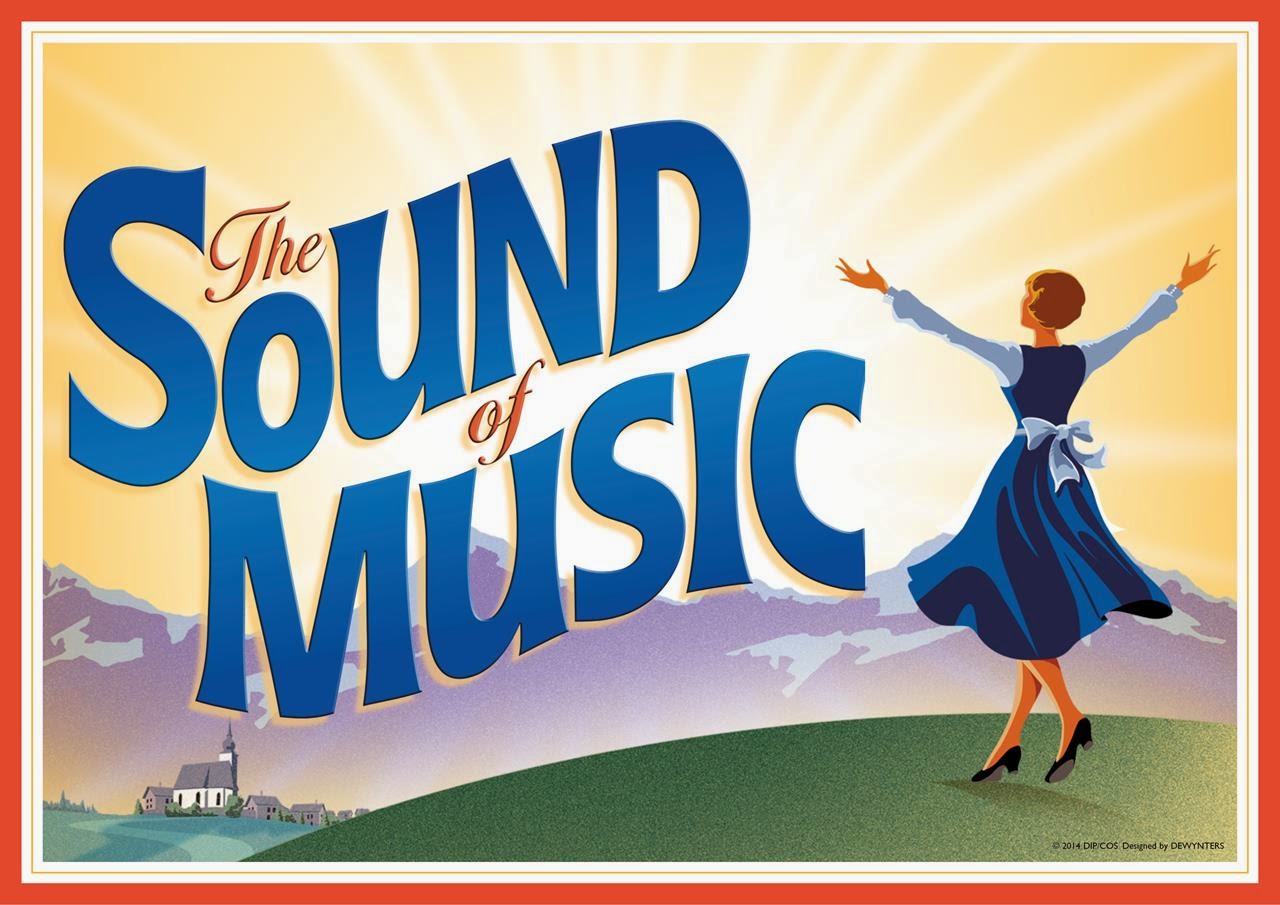|
인물 현대사 - 경계를 넘어서 - 윤이상 |
|---|
|
1995년 11월 3일. 독일 베를린 슈타이거발트가에서 한 동양인이
세상을 떠났다. 하프와 플륫으로 그가 작곡한 음악이 연주되고 한국에서 온 두 스님의 목탁소리가 그 죽음의 길을 인도했다. 조사도 울음도 없었다. 유언에 의해 장례는 20여명의 지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침묵 속에 진행됐다. 그 장례식의 주인공, 그가 바로 한국인 작곡가 윤이상이었다. 독일 언론은 다투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는 누구나 공인하는 현대음악의 거장이었다. 그는 동서양의 음악세계를 종합하여, 한계에 다다른 서양현대음악을 구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작곡가의 한사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계음악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인물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윤이상, 그의 이름은 세계 각국에서 존경과 환대를 받았지만, 오직 그의 조국 땅에서만 존경과 환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했던 조국 땅에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 뭍였다. 그가 끝내 조국 땅을 밟지 못한 건 그에게 씌워진 간첩이라는 죄목 때문. 그는 과장 조작된 간첩단 사건인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모진 고문과 탄압을 받았고 간첩죄로 사형을 언도받고 복역했다. 독일 정부의 항의와 석방요구에 힘입어 윤이상은 1969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석방, 독일로 돌아가 베를린 시민으로 정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는 여전히 빨갱이였다. 남쪽 사람들에게 그는 기피대상이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민족이 근본이라는 그의 믿음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장벽에 부딪쳐야만 했다. 분단을 넘어서려는 그의 노력은 남북에 상반된 반응을 불러왔다. 북은 민족적인 전통을 현대음악에 결부시킨 윤이상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1979년 윤이상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윤이상을 반겼으나, 남은 윤이상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는 진정으로 남과 북의 이념적 경계를 넘어 서고자 했다. 그의 음악 창작의 근원은 조국의 소리와 전통, 그리고 조국의 분단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땅의 분단상황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실천했던 윤이상. 남과 북 모두를 끌어안고 경계를 넘어 통일 대의에 신명을 바친 '상처받은 용'! 그러나 아직도 윤이상은 복권되지 못했다. 해마다 그의 고향 통영에서는 그를 기리는 음악제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명예는 아직 공식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윤이상 그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0 703
|
- 2.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성령 강림 대축일
- 3.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이수철 신부님_혼인과 이혼
- 4.우리들의 묵상ㅣ체험 부활 제7주간 월요일
- 5.우리들의 묵상ㅣ체험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게시판 운영원칙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Help 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