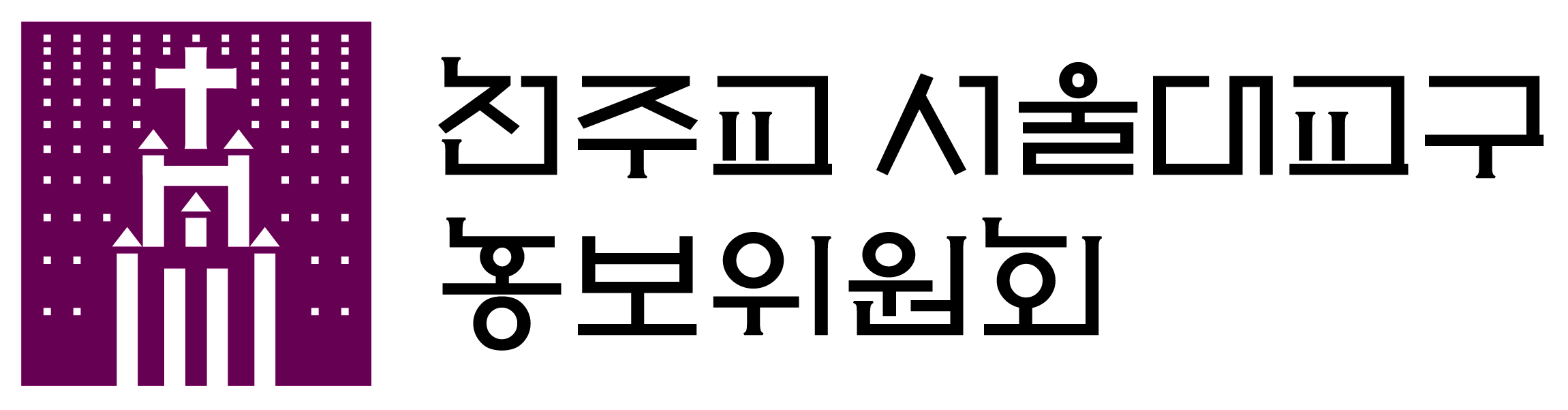|
21년째 ‘나눔의 전화’ 상담 표화순씨 "당신은 소중합니다" |
|||
|---|---|---|---|
■ 21년째 ‘나눔의 전화’ 상담 표화순씨 “띠리링-” 전화가 울린다. “어휴…죽고 싶어요”한 할머니의 한숨 섞인 말이 수화기에서 들려온다. “무슨 이유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전화를 건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413호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나눔의 전화’(752-4411, 752-4413) 상담실의 한 장면이다. 나눔의 전화는 1983년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창립된 전화상담기관이다. 가족 및 부부간의 갈등 속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전화나 성문제나 약물중독 등 각종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전화, 또는 단지 대화상대가 필요해 건 전화까지 모두 환영한다. 나눔의 전화에는 자체 교육을 거친 상담원 80여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이 교대로 10평 남짓한 상담실의 전화 2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어놓고 있다. 표화순 씨(61)는 이곳에서 21년째 상담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매달 2번 3시간씩 2회 상담활동을 벌인다. 많게는 하루에 8통의 상담전화를 받는다. 상담원이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담은 한 달에 2일 정도로 제한돼 있다.
표 씨가 나눔의 전화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84년. 성당에서 선교 상담 교육을 맡고 있었는데 가톨릭교회 안에서 전화 상담을 시작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관된 일이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뜻 발을 들였다. 4개월의 교육을 받고 상담대에 앉을 수 있었다.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는 전화벨이 울리면 화들짝 놀라기 일쑤였다.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나눔의 전화가 24시간 운영됐었기 때문에 철야 상담을 마치고 내려오는 표 씨에게 경비원이 “왜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 내려오세요?”하고 물었다. 밤을 새운 표 씨는 내담자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같이 울기도 했으므로 극도로 지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철야 상담원 가운데는 밤새 상담에 임하고 아침에 주간 상담원들과 교대한 후 명동성당에서 내담자들의 고통을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고 곧바로 직장에 출근하는 이들도 많았다.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몸살을 앓았다. 남의 이야기지만 절절한 사연과 고민을 듣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다음 상담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담대에서 일어서는 순간 내용을 잊어버려야 한다. 하지만 초보자인 표 씨는 그렇지 못했다. 몸살이 없어지기까지 1년이 걸렸다. 지금은 8개의 소그룹이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팀 모임을 가지며 심리상담교육 및 신경정신과 의사와의 면담을 하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좋아졌다. 언젠가 남편 때문에 죽고 싶다는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죽을 수도 없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른 셋의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남편, 손자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욱하는 성격의 남편 때문에 며느리가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며느리가 아프니 따로 나가 살자고 해도 ‘안 된다’면서 폭력까지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표 씨는 약 40여 분간 울며 호소를 하는 할머니와 같이 울다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이래저래 좋은 방법을 강구해 봐도 그 연세의 할머니에게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가슴만 답답했다”며 그 때의 상황을 회상했다. 상담효과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누군가 자신을 잡아주길 기대하며 전화를 건다. 그럴 때 상담원이 하는 일은 간단하다.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전화를 걸었다고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처음에는 격앙된 음성으로 대들듯이 말을 시작하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고 상담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경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자신의‘진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화려한 설득기술보다는 스스로 말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상담원의 첫째 덕목이 된다. 표 씨는 “2년 전 일어난 대구 지하철 참사의 장본인도 사건을 일으키기 전 나눔의 전화에 한 통만이라도 전화를 걸었더라면 그런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군가에게 후련하게 속내를 이야기하고 나면 주변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상담 자원봉사를 한 지 21년째가 되면서 세상이 변한 것을 실감한다. 처음 시작했을 때 표 씨는 주로 가정문제로 고민하는 여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최근에는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전화가 늘었다. 치료비가 비싸 병원 대신 나눔의 전화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여전히 누군가는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표 씨는 “내가 받은 전화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만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참고> 2004년 한 해 동안 걸려온 상담전화(총 상담건수 4,906건)의 유형을 통계해 본 결과, 부부문제 및 가정문제가 3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밖에 상습전화 11.8%, 사회문제 9.2%, 정신건강 7.2%, 성문제 8.5% 등의 상담이 뒤를 이었다. 부부문제(총 1,092건)는 성격차이가 309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외도가 292건(26.7%)으로 나타났다. 가정문제(총 880건)는 자녀교육문제가 180건(20.5%),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132건(15.0%), 시가와의 갈등이 96건(10.9%), 형제간의 갈등이 87건(9.8%)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이혼가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상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결과이다. 용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나 받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짐을 던다. 고해소 안에서 누군가에게 행하거나 받은 상처를 드러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경정신과를 찾는 환자 중 가톨릭신자의 수가 가장 적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고해성사의 기본전제는 자신과의 용서와 화해다. 가끔 주위를 둘러보자. 용서와 화해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0 571 |
- 2.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연중 제10주간 금요일
- 3.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이수철 신부님_주님의 전사(戰士)
- 4.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이수철 신부님_참행복의 제자리
- 5.우리들의 묵상ㅣ체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게시판 운영원칙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Help 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