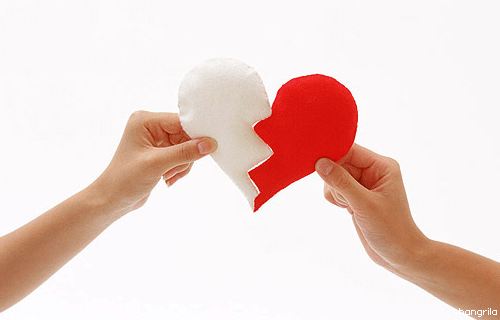오랜만에 시집 댓 권을 내리 읽었다. 내리 읽었다는 것은 시(詩)에 대한 모독일지 모른다. 찬찬히 씹고 또 씹어 시어(詩語)가 입속에서 잘게 부숴질 때 남는 진액의 쓴맛을 얻지 않고서야 어디 시를 읽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구에 둥지를 틀고 사는 이성복의 시가 그렇다. “검은 장구벌레 입속으로 들어가는 고운 입자처럼/ 생은 오래 나를 길렀네/ 그리고 겨울이 왔네.” ‘來如哀反多羅’라는 이두문자 제목이 붙은 시는 수십 번을 중얼거려야 시인이 겹겹이 쳐놓은 은유의 빗장을 풀고 감각 중추에 닿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리 읽었다. 더러는 아름다웠고 더러는 아름답다 말기도 했다. 어쩌다 재판정에 서게 된 안도현의 시였다.

왜 그랬을까? 남달리 많은 애독자를 둔 시인, 그의 시가 교과서에 실릴 만큼 청소년의 문학적 상상력과 언어세계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시인이 투박한 법정 용어와 거친 언사를 서슴없이 쏟아내게 된 저간의 사정이 궁금해졌던 거다. 수천 명 문인(文人) 가운데 그래도 이름이 꽤 알려진 시인이라면 정치의 옹졸한 장벽을 순간에 용해하는 언어의 비장한 힘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순진한 생각 때문이었다. 김무성 같은 무쇠정치인이 찌라시 운운하는 것에 기막혀 할 일은 없다. 정권 출범 이후 9개월간 계속된 지리멸렬한 정치판 싸움에 이골이 난 터이니까. 그런데 궁색하기 짝이 없는 사건의 전말도 그러려니와 그 한가운데 선 시인(詩人)까지 거칠고 모진 말을 쏟아내고야 마는 천박한 풍토 때문에 이 가을이 무척이나 황량해진다. ‘나 이제 정치인’이라 선언한다면 더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원래 패장의 부하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다. 싸움을 책임진 공동선대본부장이라면 무슨 말인들 마다하겠는가.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다급해진 ‘정치인 안도현’이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 및 소장에 관여했다’고 근거 없이 폭로한 것은 좀 치졸한 행위라고 쳐도 그걸 못 참고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검찰은 더욱 치졸했다는 비난을 들어 족하다. 정치는 이런 원색적 비방으로 엮은 대거리 두름처럼 보이는데, 뭇 사랑을 받는 서정 시인이 굴비처럼 끼였다는 게 안쓰럽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평결을 살짝 비튼 법정의 최종 판결에 시인은 분노했다. 재판부가 배심원을 조롱했으며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묘기를 부렸다는 것.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은 이 사건 속에 잠재된 시대적 모순의 복합방정식을 풀려고 애쓴 고뇌가 역력하다. 치졸한 싸움을 격조 있는 법 해석으로 점잖게 타일렀다는 느낌도 든다. 시인은 승복하지 않았다.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로 자신을 빗댔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의 시처럼 ‘찬란한 끝장’을 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연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안도현 작, ‘반쯤 깨진 연탄’).
이 시를 쓸 때 ‘찬란한 끝장’의 상대가 검찰, 법원, 혹은 보수정권 따위는 아니었을 것이다. 시인은 그가 보좌했던 ‘문재인의 웃음’에서도 끝장 볼 것을 찾아내고야 마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서정성으로는 윤동주와 유치환에 못 미치고, 가끔 신동엽, 김춘수, 이성부, 양성우의 시상(詩想)을 오락가락하는 시인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일지 모른다. 해직교사로서 울혈을 품고 살아온 그에게 러시아의 혁명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 혹은 칠레의 저항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들이댈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독자가 많다는 것, 청소년의 시상(詩想)을 지키는 중요한 멘토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정치에 휘말려도 시어(詩語)를, 시(詩)정신을 잃지 말아야 함을 일깨운다. 시는 전복이고 혁명이다. 가장 시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임을 독자들은 알고 있다. 가장 시적이었던 윤동주는 불멸의 저항으로 지금도 반짝이고,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백로처럼 나부끼던 유치환은 한때 암흑기 일제 시대를 건너는 우리의 등불이었다.
문학은 공식 역사로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건져 올리는 언어의 집이고 문인(文人)은 그걸 짓는 설계사이자 건축 노동자다. 정치는 ‘모든 이를 위한 합창’이기를 외치지만 언제나 그 약속을 배신한다. 시인, 아니 많은 문인들이 그 배반의 합창에 끼려고 정치에 어렵게 투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행동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스페인 내전에서 경험한 유혈의 기억을 장엄한 서사로 승화시켰다. 좌파도 우파도 함께 공감하는 ‘모든 이를 위한 노래’가 그것이다. 정치에 휘말려 소실되는 시인들이 더 출현할까 우려돼 하는 말이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




 게시판 운영원칙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Help Desk